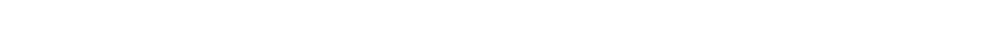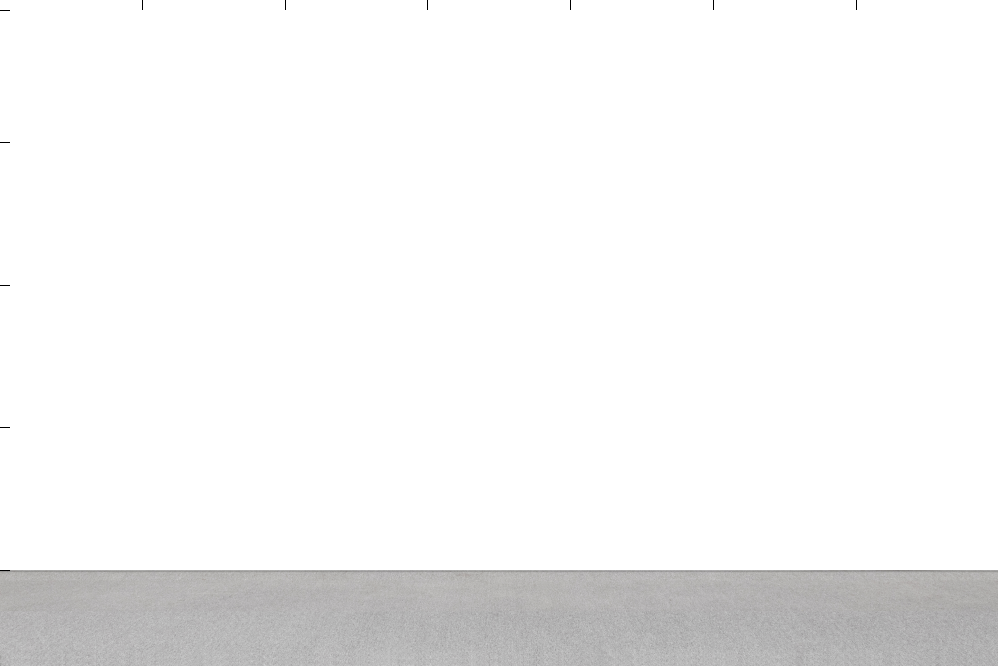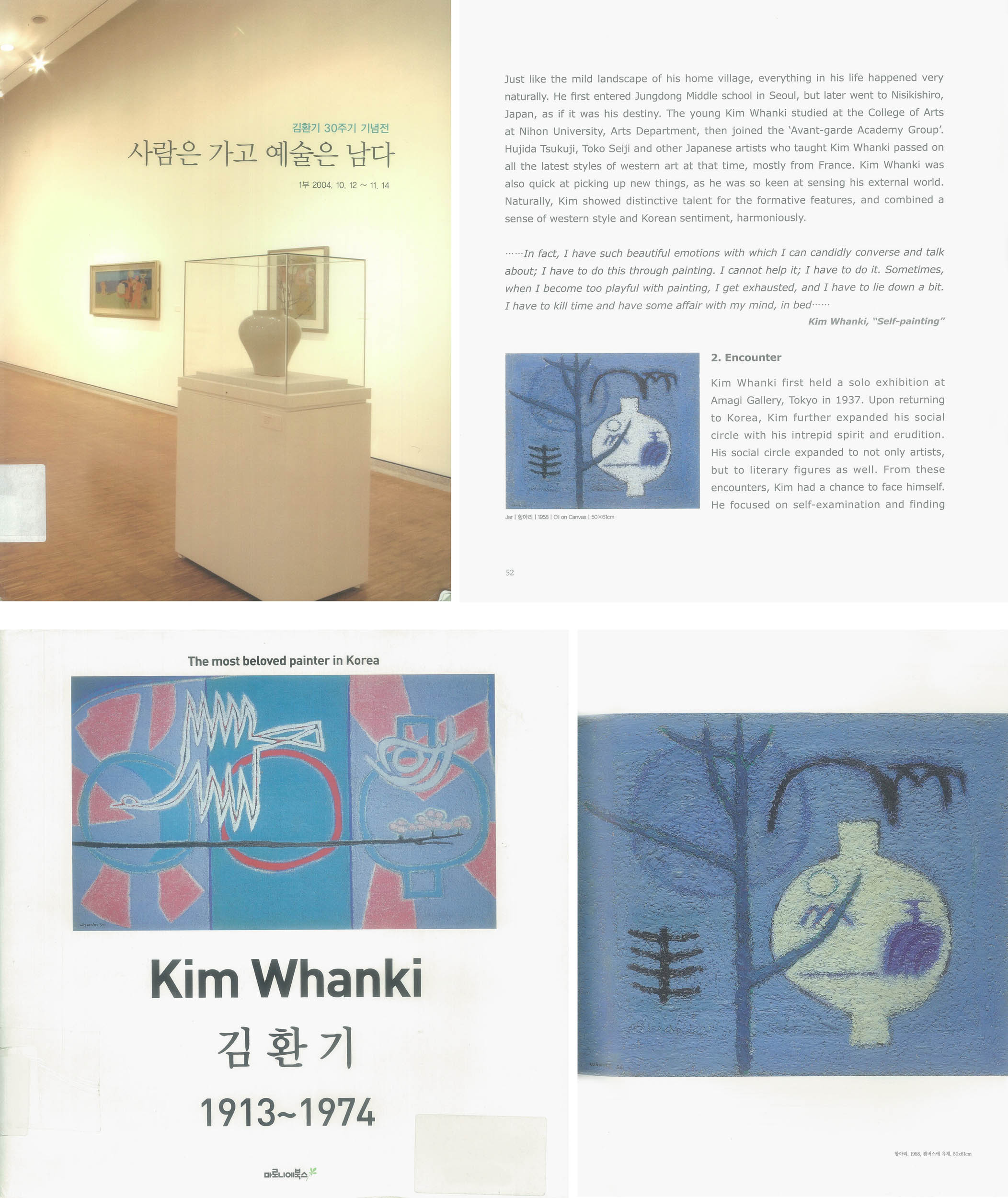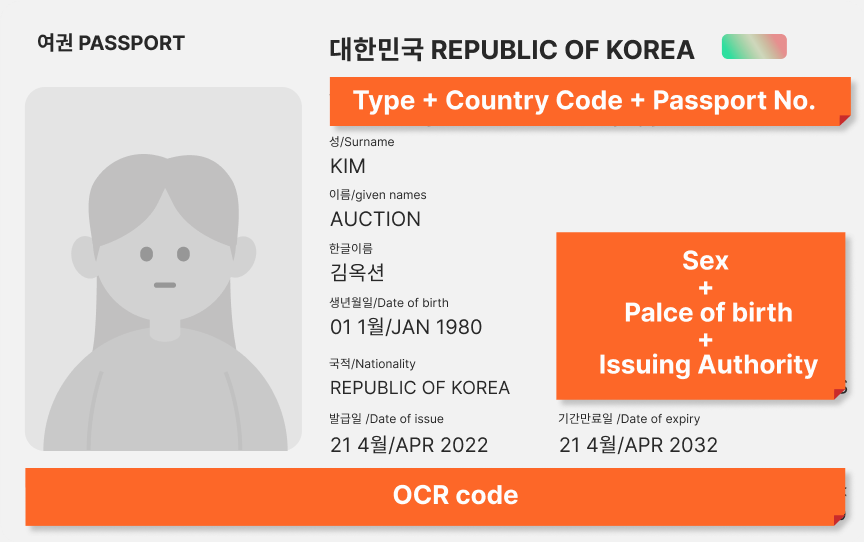Website inquiries
- Name *
- Telephone
- Select Topic or Issue
- Select Topic or Issue
- Device Used
- Select Device
-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device 0 / 500
- Description* 0 / 1,000
Please report website-related issues, inconveniences, or provide suggestions only. For inquiries regarding artworks, consignments, or bidding, please contact the person in charge or the main number (+82-2-3479-8888)
-
Attachments
-
 Drag the file to attach
Drag the file to attach
- Purpose of collection and usage: Performing tasks such as reporting errors and improvements, assessing report content, etc
- Information collected for communication: name, contact information, email
- Information collected for problem assessment: subject of inquiry, operating system used
- Retention and usage period: collected information will be deleted after action on errors and improvements (3 year-period)
- Right to refuse consent: You may refuse to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. However, this may result in difficulties or delays in reporting problems and issues.
※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will not used for any purposes other than the above and will not be provided to third parties.